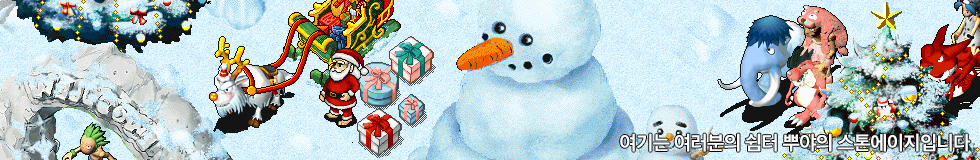소름 끼치는 어둠이 내렸다. 하늘은 온통 까마귀 떼로 어우러진 듯 너무나도 컴컴하고 아득한 빛이었다.
사람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이동했다. 흘깃보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느껴지지않는 그런 존재의 기운은 아니었다. 단지 기척 하나로 그 모든걸 느낄 수 있다며 망언을 하는 누군가의 말소리만이 뚝뚝 끊기며 들릴 뿐이었다.
악취로 가득한 거리에는 온통 패배자들의 역겨운 흔적이 남아있었다. 누군가를 찔러죽인 핏자국, 앞뒤 분간 못가리고 자신의 좆대가리만을 밀어넣는 추악하고 더러운 자취, 비명소리가 잔잔하게 들리우는 이곳은 그 옛날의 지옥을 보는거와 같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뜬 직후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도 섬뜩하였다. 살육에 눈이 먼 자들이 제일 먼저 내 앞에 나타나였고 난 그들을 피해 멀리멀리 도망을 쳤다. 들끓는 구더기와 썩어문들어진 시체에 고인 물에서 나는 썩은 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삶을 포기한 자들이 보였다. 그들도 처음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내일은 아무 일도 없을거라고, 지금 내가 처한 일은 앞으로의 세상에 비하면 뭣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희망이란 소리 없는 아우성을 그만두고 이 상황을 받아드리기로 했다. 불투명한 미래는 그들은 더욱 더 피폐하게 만든다. 삶이란 행복한 것이라며 매일 노래를 부르며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들 역시도 결국엔 그 꼴이 되고 만다. 한편으로는 우스울 법도 하지만 그게 이 나라의 정도이자 이상향이었다. 그 어떤 누구도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회. 저항하는 이들의 말로는 끔찍하게 살해당하거나 뜯어먹혔다.
담담한 촛불에 데인 상처가 아려온다. 따끔하지도 쓰려오지도 않았지만 괜시리 시큰거리는 통증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만든다.
후-
가련한 바람으로 불을 꺼보지만 꺼진 촛불은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해 아까보다 더 활활 타올랐다. 그 모습에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어처피 그 끝은 깊은 침묵일텐데 왜 그렇게 바득바득 살아나려하는걸까. 미련한 투정이라고 봐야하는걸까? 진실을 앎에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기대어 고집을 부리는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행동의 끝은 비참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겠지. 모두들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사라졌어. 난 그 모습을 지켜봤고.
낡은 가게 하나가 보였다. 이 가게, 얼마 전까지는 운영했던걸로 기억한다. 불과 며칠만에 이 꼴이 난걸 보면 이곳에 있던 사람들 역시 더 이상 버티지못하고 변해버린걸지도 모른다. 현명한 선택이다. 버티려할수록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사실을 눈치챈거지. 이미 이 나라는 죽었으니까 굳이 살아있을 이유는 없잖아? 왕도 백성도 없는 황폐해진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죽음이란 말로에 거의 가까워진 녀석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지. 본래 가져서는 안되는 악한 감정이 이젠 이곳의 법률이 되어 펼쳐진다. 무척 아름답지않은가? 그걸 보는게 얼마나 쏠쏠한 재미인지 아는 자는 극히 드물지만 나는 즐겁다.
삐걱거리는 의자소리, 짜그락거리는 젓가락과 그릇들. 만들어놓은지 오래된 음식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살랑이는 바람에 휘날리는 곰팡이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나도 이미 그들과 똑같은 인격체가 된걸까? 먼지 덮힌 식탁 위에 새겨진 알 수 없는 글귀가 눈에 띈다. 뭐라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이건 유언 같은게 아닐까싶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텨 너덜너덜해진 몸뚱이로 겨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되선 도통 알아볼 수 없는걸. 후훗, 이게 뭐라고 웃음이 나오는거지.
덜컹 -
전보다 걷세진 바람 덕에 금방이라도 문이 떨어져나갈 것처럼 덜컹거린다. 이제 그만 나가야지. 뭐라도 건질게 있을까싶어서 왔거늘, 괜히 시간만 허비했다.
꼬르륵.
배가 고프다. 밥을 안 먹은지 꽤 되서 그럴지도 모르지. 최근에 먹었던게 사흘 전인가? 아무튼 운 좋게 눈에 띈 빵 부스러기로 간신히 허기를 달랬기 망정이지, 그거 마저도 먹지 못했다면 굶어죽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단 그러는 쪽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있고 싶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나고, 보기 싫은 광경이 펼쳐지고, 끔찍한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내 스스로가 숨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쉽사리 삶을 포기할 수 없는걸지도 모른다. 이제 나에게도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없다. 그렇기에 더욱 더 갈구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 이 끝의 말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길 바란다. 그때가 되면 나는 없겠지만 그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날테니, 나는 그들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고 싶다.
비열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 그 속에 섞여 서로를 물어뜨는 짐승들, 피가 난무하고 살덩이들이 즐비하는 이곳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끝 없이 작열하는 태양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 시체를 파먹으며 행복한 군침을 흘리는 기생충들까지, 이 공간에서 모두 함께 살아간다.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한다.
이제 두 번 다시, 눈을 뜨고 싶지않아...
공허한 웃음이 가득한 하늘 위에, 하늘거리는 장막을 뒤집어쓴 달이 있었다. 반짝이는 눈망울은 샛노란 향을 띄며 대지를 비추었다. 그 자리엔 조그맣게 모습을 드러낸 달맞이 꽃이 피어있었다.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린 꽃망울은 너무나도 가련한 이슬을 품에 안은 채 달을 향해 꽃잎을 펼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