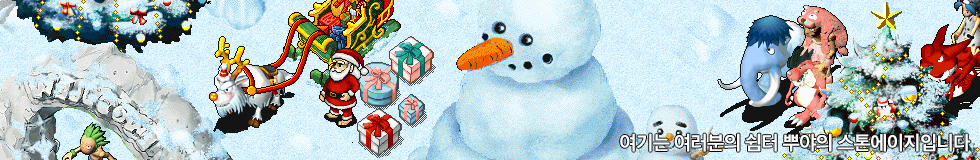매우 끈적거리면서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축축히 젖어 찌든 때로 번진 옷가지만해도 산처럼 쌓여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단수 때문에 빨래를 빨 수도 몸을 씻을 수도 없다. 간간히 비축해놓은 물로 일단 응급처치를 하곤 있으나 이마저도 넉넉지않다.
언제나처럼이지만 굳게 닫힌 통조림도 이제는 거의 바라보는 수준으로 퇴화되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않던 반찬들도 지금은 그림의 떡이다. 세상에 재앙이라도 몰려온 듯이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만가는 집안 꼴 덕분에 이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도 까먹게 되었다.
긁어먹던 밥이 딱딱하게 굳어 따가운 촉감을 지녔다. 한동안 돌보지않은 탓에 내 몸도 많이 지쳐있었다. 무언가를 먹고 기운을 내서 이곳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옮겨보겠다하는 생각도 이제는 가물거린지 오래다.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것또한 감사하게 여기는건 아니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되면 그것을 기존에 있던 모습으로 바꾸어놓겠다는 생각은 지웠다. 그건 내 힘으로든 누군가의 지시라도 돌이킬 수 없어서다. 나도 이렇게 내 자신이 비참한 꼴이 될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그런데 머지않아 이렇게 되더라고.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어떤 이를 자책하거나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그저 이 삶에 지치고 투정을 부릴 힘조차 잃어버린 공허함 때문이다.
'살고싶다' 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 정도로 괜한 추태는 보이지않는다. 내가 죽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많이 남은 식량이 있다. 악취는 나지만 그렇다고 못먹을 정도는 아니지. 설령 이걸 먹고 내가 병에 걸린다한들 먹거나 안 먹거나 내가 선택할 사항은 아니잖아?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있다.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진 씁쓸한 일이라던지 그 누구나 적응할 수 있고 순응할 수 있다. 다만 개인마다 받아드리는 시간과 혼란이 거칠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입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양치질은 안한 탓이 컸지만 뭐 상관없겠지. 빈 통으로 널부러져있는 통조림. 너무나도 시간이 흐른 탓에 이젠 파리까지 꼬이지않는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유일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것만 같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바닥이 내 온기를 앗아가고 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갉아먹는 식인귀처럼 말이다. '밥이라면 저기 많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빳빳하게 굳어 금세 부서져버릴거같은 내 입술은 굳게 닫혀있었다. 약하디 약한 숨마저도 그 미세한 구멍을 지나갈 순 없었던 모양이다.
끼리릭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창문 밖에 있는 나뭇가지가 유리를 긁은 것이겠지. 한동안 안들리더니 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마치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는거처럼 말이야. 아쉽게도 난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고싶어서 살아있는건 아니었지만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딱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있어서는 안된다. 째깍째깍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자신의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는 시계바늘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며 그런 나를 조롱하는 듯 내려보고 있다. 이제 살다살다 이런 경우도 다 겪어본다.
나는 언제부터 이 모습으로 있었던걸까, 내가 이렇게 있는동안 시계바늘은 얼마나 많은 목표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을까, 가만히 아무 것도 바꿔보지도않고 이 흐름에 몸을 맡겨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나락으로 흘러만 가고 있었던걸까. 살고 싶다는 욕망도 살고자하는 바람도 흘러가는 무기력함에 휩쓸려 사라지고 만 것인가. 이토록 바보 같고 한심스러운 경우가 있을까.
내 마음은 멈추어있었다. 그 어떤 것도 바뀌지않았다. 잘만 나오던 물이 단수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평범한 일상 내 밥상 위에 항상 놓여져있던 소고기 장조림도 그 어떤 무언가도 달라지지않았어. 그저 내 자신이 귀찮고 나태해졌을 뿐이었지. 어느 순간부터 낙을 잃고 정처없이 떠도는 낙엽이 된 나를 보며 내 스스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느낀거겠지.
찌뿌둥한 몸, 푸석해진 얼굴, 새집마냥 겹겹이 뭉쳐진 머리카락. 갑자기 신경쓰지않았던 모든 사소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닥에 맥 없이 널부러진 신문지마냥 구겨진 채로 이게 나의 모습이며 나의 삶이었거늘하고 넘겨짚은 듯했다.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어 자리에 앉아보았다. 누워있을 때는 잘 보이지않던 많은 풍경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장난삼아 펜으로 칠했던 색색의 낙서가 담긴 벽지, 몇 년 전 고기를 급하게 씹어넘기다 목에 걸려 결국 자기 혼자서 2kg이나 먹었던 집 나간 길순이의 인형,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아주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담긴 오래된 액자. 다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은 불어 창문을 두들겼다.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도 나에게 왔다 지나간다.
이런 나를 부끄럽거나 한심하게 여기지않고, 그렇게 불어왔다.
P.s : 2016.01.10 ~ 2016.01.14.
그냥 소리 없이 가기에는 좀 그래서 짤막하게 올려봅니다. 올해도 모두 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