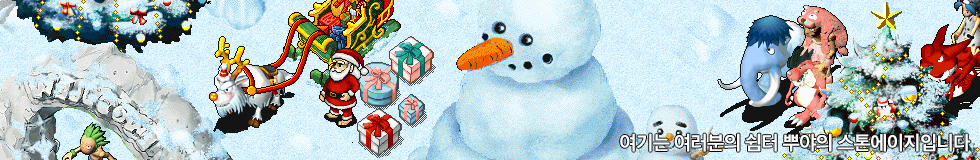Exist in the dark ocean of life the faint
[ 어둠 속 존재하는 희미한 생명의 바다 ]
- 태풍과 폭풍의 경계선 -
No.7
"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더럽게 내리네요. "
" 그러게, 아직 마리너스엔 해산물 축제 못 열었다고했지? "
" 피유가 말해줬는데요, 작년보다 해산물 수확량이 적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고 장로분들이 말씀하셨데요. "
" 그렇겠지, 하아. 왠지 아쉬운걸. 매년마다 꼭꼭 무슨 일이 있어도 축제는 했었는데. "
엄마가 씁쓸하신 듯 웃으면서 조용히 컵을 들어 입을 갖다대신다.
벌써 비가 내린지 나흘짼데, 비는 도통 그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통 이쯤되면 비도 서서히 맥을 못 추리고 빗줄기라도 얇아져야하는데, 얇아지긴 커녕. 전보다 2~3배는 더 굵어진 듯보인다. 조용해지는 밤만 되면 칠흑 속에서 창 밖은 ' 퐉 - 퐉 ' 소리가 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도 나도 눈가에 다크서클로 아침을 맞이했고, 나흘동안 아빠는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다. 비만 내리면 아빠는 해양탐사로 바쁘셨으니,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엄마도 기운이 없으신지 식탁에 앉아 멍을 때리는 시간도 많으셨다. 나는 뭐, 하루 하루가 멍으로 시작해서 멍으로 끝나니 별 상관은 없지만.
' 탕 - 탕 '
멍을 때리던 엄마와 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멍에서 풀려났고, 무슨 일이냐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엄마에게 내가 가겠다며 엄마를 앉히고,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묻자, 낯 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 형, 나야. 피유. "
피유?
" 피유? 너가 무슨 일로. "
" 일단 문 좀 열어줘, 다 젖겠어. "
피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일단은 밖에 비가 너무 많이오니 안으로 먼저 들여야겠다는 생각에 문을 여니, 비에 홀딱 젖은 채, 우뚝 서 있는 피유의 창백한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 ! "
달걀귀신을 본 마냥 놀란 나는 피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피유는 베시시 웃으며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며 떨리는 다리로 가까스로 안으로 들어온다. 식탁에 앉아 계시던 엄마는 누군가하고 고개를 빼꼼히 내미셨고, 비에 홀딱 젖은 채 물을 뚝뚝 흐르고 들어오는 피유를 보며 깜짝 놀라며 소리치셨고, 나에게 엄마는 "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너는 수건도 안 갖다주냐 이 매정한 자식아! ' 라고 말씀하신 후 서둘러 수건 2개를 들고 달려오신다.
" 피유야, 어서 닦아라. 그렇게 있다가 감기 들면 큰일 나! "
피유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엄마가 말씀하신다.
" 괜찮아요, 조금 젖은 것 뿐이… 에.. 에엑 - 취 - ! "
부르르 떨리는 몸으로 피유가 재채기를 하자, 엄마는 더 놀란 얼굴로 나에게 얼른 피유를 따뜻한 물에 씻기라며 강제로 욕실 안으로 집어 넣으셨고, 내 옷장에서 옷 몇개 꺼내서 입히라면서 언제 꺼내셨는지. 내 옷과 속옷까지 던져주시는 매너를 행해주신다.
그러는 동안, 수건에 감아서 겨우 체온을 유지하던 피유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서둘러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인다.
한 참동안 씻던 피유가 문을 열고 나왔고, 뽀샤시한 얼굴을 들이밀며 ' 나 어때? 괜찮아? ' 하며 장난을 친다.
그런 피유를 나는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쳐다봤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자신을 골똘히 쳐다보는 나를 보고 피유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진다. 의자에 앉아서 피유를 보던 나는 피유를 불러세웠고, 피유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다가온다.
다가온 피유를 나는 아무 말 없이 쳐다봤고, 아무 말 없이 자신만을 쳐다보는 내 시선이 조금은 어색한 듯 피유가 몸을 베베꼬며 왜 그러냐며 웃지만, 나는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왜 피유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우리 집에 온 이유가 궁금했다. 뭐, 비가 많이 온다고 놀러온게 이상한게 아니라. 왜… 하아, 관두자.
" 한가지만 물어볼게, 피유. 너, 왜 우리 집에 온거야? "
목소리를 깔고 쓰윽 쳐다보는 나를 보자, 피유는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러더니, 말문을 열 듯 말 듯 망설이는 피유를 보며 나도 모르게 소리치자. 옆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대신 쿠키 한 주먹의 포근함을 느끼던 엄마가 깜짝 놀라며 왜 그러냐며 달려오신다.
피유는 경직 된 몸으로 한 참을 자리에 서 있더니, 이내 한 숨을 내쉬며 나의 눈치를 살살 본다. 저 눈빛 왠지 마음에 안 든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뿐더러, 피유의 한 쪽 마음이 떨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건지, 내심. 무서워진다.
" 형,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충격 받지 말고. 들어, 아주머니도요. "
한 참을 망설이던 피유의 말문이 열렸고, 그 열림의 동시에 충격먹지 말라는 피유의 말에 나와 엄마는 조금은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피유는 한 숨을 크게 내쉬더니, 이내 우리 집에 온 이유를 설명했고, 그 목소리는 꽤나 안쓰럽게도 떨리고 있었다.
한 참동안 엄마와 나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도 어질한지 주춤했고, 피유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엄마와 나는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한 참동안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도, 자신의 부모로 인해 태어난다. 박테리아든, 기생충이던 간에 말이다.
그들 중에서 부모님을 거치지 않고 태어나는 생명체는 없다, 모든 생명체는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나고 또 세상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부모가 되고 만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주 어린 꼬꼬마들도 언젠간 나이를 먹고, 세상에 대한 물정도 알면서 성장한다. 그렇게 되는 과정은 그리 까탈스럽지가 않다.
세상을 살기 위해선 자신만의 힘으론 부족하다,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들은 안심을 하고, 섣불리 다가설 수 없는 일에도, ' 같이 ' 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있던 힘이 불끈 불끈 솟아나기도 한다.
오랜 인간생활을 하면서, 진화를 거친 인간들이 그래왔듯이, 혼자서는 생활하지 못할 세상살이를 같이한 ' 친구 ' 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그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랑 단어는 태어난 시점부터 배우게 된다.
그 친구라는 단어를 배우는 상대는,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부모이자, 새 세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부모가 된 자들. 우리를 지도해주고 세상에 대해 깨달음을 주는 상대가, 부모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몇몇 있을까?
언젠까지도 함께한다는 부모이자 친구인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쇠퇴해져, 조용히 자연의 품으로 사라진다. 그 자연도 언젠가는 메말른 토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들은 슬퍼하지않을테니. 그 이유는 혼자가 아니니까.
나 역시, 엄마와 아빠로 인해 태어났고. 세상에 대한 물정도 그들에게 배웠다. 친구이자 부모, 부모이자 친구인 그들에 손에서 난 언제까지나 빌붙어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간 나도 그들이 이루어진 쾌거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내 스스로가 부모가 되어, 새로히 태어나는 내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내가 탄생시킨 그 친구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 새로운 친구를 맞이하고, 그 탄생도 언젠가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한다는 사실은, 언제 들어도 신기하고 한 편으로는 눈물이 흐른다.
사람들은 대게 3번의 삶을 산다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한 번의 삶은 ' 탄생 ' . 태어나서 밥을 먹고, 사물을 익히고 언어를 배우고 ' 친구 ' 라는 단어를 배울때. 두 번의 삶은 또 다시 ' 탄생 ' . 하지만 이 탄생은 자신의 탄생이 아닌, 세상을 위해 그리고 새 세상을 위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탄생, 즉 우리 스스로가 부모가 되는 날이 바로 두 번째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의 삶은 ' 죽음 ' 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먹으면 언젠간 생명체는 죽는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법칙이라고 어릴 적 아빠가 말씀하셨다. 나 역시, 언젠가는 두 번째 삶을 맞이하고, 세번째 삶도 맞이할게 분명하다. 나도 언젠간 늙을테니깐.
그런데 아빠는 세 번의 삶을 얘기하실때마다 몇 분간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한 참을 푸른 하늘을 보며 피식 웃으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셨다. 그때에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조차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가지 알게되는 사실은. 언젠간 우리들은 죽는다, 하지만 '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또 다른 나일테지 ' 라는걸.
내 부모님들도 언젠간 돌아가신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누구보다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니깐, 그런데. 피유의 말을 듣고나서 엄마와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실이 아니라는 눈빛을 보낼 수 밖에.
" … "
안녕.
P.s : 으어어, 즐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