슥 스윽 삭 사악
대민지원으로 여념이 없는 한 시골 농촌. 추수철을 맞아 황금빛으로 가득한 논논마다 군인들이 한 무더기씩 들어가 추수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 몇 분이 새참을 들고 분주하게 오가며 아들을 보는듯한 대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구슬땀 흘리며 열심히 벼를 베는 그들에게 시원한 가을바람을 후후 불어주었다. 김도운 일병은 그중에서도 발군의 속도를 자랑하며 논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다.
“어이구, 자네 참말로 잘하는구마이. 집에서 농사 좀 짓다 왔는가?”
손녀사윗감으로 눈여겨보았는지 할머니 한 분이 새참을 먹으라고 김 일병을 부르며 칭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혼자서 서너 명 분을 해치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하, 아니에요. 올 여름에 풀을 좀 깎아봤더니 낫이 손에 좀 익네요.”
김 일병은 올 여름 사수인 서도행 병장을 따라 풀을 깎으며 돌아다녔다. 특이한 것은 보통의 예초병처럼 예초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낫을 들고 그 넓은 군부대의 풀을 모조리 깎았다는 것이다.
“저기 저 사람을 보세요.”
김 일병이 새참을 한 술 뜨며 가리킨 곳에는 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보통 논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쭈욱 나래비를 서서 추수를 하는데 그는 논의 중심에 서 있었다.
“쟈는 저기서 뭐 한댜? 총각! 나와서 새참 먹고 햐!”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손을 한 번 흔들고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한 순간. 빙글빙글 무엇인가가 그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공간을 잠식해 들어갔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정도 굵기의 쇠사슬이 칭칭 감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줄에는 커다란 낫 하나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빙빙 돌면서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벼를 휩쓸며 휘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메.”
김 일병과 할머니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이 그를 중심으로 반경 삼십 미터에 달하는 공간의 벼가 모조리 깎여나갔다. 이제 됐다 싶자 그는 슬슬 낫을 돌리는 속도를 줄이더니 쇠사슬을 단숨에 잡아당겼다. 그러자 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어느새 낫은 다시 그의 손에 고이 들어와 있었다.
“아이구, 힘들다. 할머니 밥 주세요.”
“서 병장님. 캬~ 그건 언제 봐도 멋있다니까요.”
서도행 병장이 다가와 할머니에게 새참을 받아들자 김 일병이 법석을 떤다. 그 사이에 새참을 모두 먹은 이들이 일어나서 서 병장이 깎은 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벼는 모두 일정한 길이로 반듯하게 잘려 있어서 모으기가 편했다.
“얌마. 너도 다 먹었으면 가서 도와. 난 이거 한 번 하면 한두 시간은 근육통이 와서. 통제 범위가 더 넓어져서인지 근육통도 심해지네. 이제 예초도 끝나서 이거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김 일병이 칫 하고 혓소리를 내며 논으로 달려가자 그는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르른 가을하늘은 눈부시게 밝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반대로 어둡기만 했다. 적어도 어느새 밥을 한 상 다시 차려온 할머니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총각, 새참 차려왔어. 어여 자셔. 그런데 총각 여자친구 있나? 없으면 내 참한 아가씨 하나 소개시켜줄랑게.”
“몇 살인데요? 예뻐요?”
“그으럼. 이쁘지. 이쟈 고등핵교 들어가.”
“;”
“에이, 나 어릴 때만 혀도 그 정도면 아가 둘은 있었어. 왜? 영계에 관심이 없나? 그럼 손녀 말고 내 막내딸은 어떤감? 이쟈 서른다섯밖에 안 됐구만.”
서 병장은 난감했다.
예초병 병장 서도행. 특기 사신의 낫, 약점 단기 방전(조루).
추계 진지보수공사의 현장. 이제 겨우 첫날 오전일과가 끝나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번 주 목표 스물다섯 개의 초소 중 절반을 끝내버려서인지 단기하사 정대수 부소대장은 싱글벙글이었다.
우르릉 쿵
그의 눈앞에서 두돈반 트럭에 실린 흙들이 허공으로 떠올라 난데없이 만들어진 습기를 머금더니 초소 앞에서 단단한 흙벽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열한 개 째였다.
“자자,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가자구. 점심 먹어야지. 점심은 내가 라면 쏜다!”
“와아!”
환호성과 함께 끼어들 일이 없어 초소 청소나 하고 있던 병력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저 심드렁하게 서 있는 건 한 명뿐이었다.
“왜, 혜주야? 냉동을 쏠까?”
정대수 하사는 고무링은 풀어 헤치고 주머니에 손을 꽂고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군대 짬밥 거기서 거기죠, 뭐. 전 점심시간 때 잠이나 잘래요. 오늘 많이 했으니까 오후엔 쉴게요. 찾지 마세요.”
이런 대범한 차림새에 대범한 말투에 대범한 일정예고라니. 내일 전역하는 말년 병장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러나 정 하사의 눈앞에 있는 것은 짝대기 한 개. 혹시, 이등별?
“그냥 오늘 다 끝내버리면 안 될까? 너도 알다시피 요즘 전역자도 많은데 신병은 없고. 인력난이잖아.”
여기서 밀리면 또 언제 맘 바꿔서 작업에 참여해줄지 모른다. 오늘도 예정일 삼일 전부터 뒤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귀찮게 굴어서 간신히 얻어낸 승낙이지 않은가. 그 악몽의 삼일에 대한 기억으로 몸서리치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다가 그만 전투화에 뭍은 진흙 한 덩이가 유난히 깨끗한 그녀의 바지에 날아가 툭 붙고 말았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전투복은 총천연색인 양 밝고 뚜렷했다. 거기에 흙 한 덩이가 날아가 붙자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바짓단에는 흙탕물로 물이 들었는데 흙 한 덩이가 대수랴.
“!”
그러나 그게 아닌가 보다. 이등별도 굳고, 정 하사도 굳고, 빗자루질 걸레질 하던 말년병장들도 굳었다. 그 순간. 흙벽이 폭발했다.
“이! 몰라 다 때려 쳐.”
신혜주 이병은 빨개진 얼굴로 히스테릭하게 외치고는 막사 쪽으로 이동했다. 흙벽이 폭발한 여파로 모두 머드골렘인 양 흙으로 뒤덮여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멀쩡했다. 게다가 이제 보니 그녀의 발은 허공에서 삼십 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허공을 밟고 있었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연달아 펑펑 터지는 소리가 열 번이 이어졌다.
정 하사가 털썩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망했다.”
말년병장들도 주저앉으며 말했다.
“정 하사님. 좀 조심하시지 않고. 아, 밑에 신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말년에 더럽게 꼬였네.”
정 하사는 다음 주 사단장 특별 순시 때문에 행보관에게 진지보수공사를 지시받은 날을 떠올렸다.
‘이번 주 내로 다 끝내 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막사부터 초소까지 부대는 전부 돌아본댄다.’
‘한 열 명 뽑아가겠습니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병력도 없는데 미싱할 곳은 많고. 운전병까지 네 명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정 하사는 말도 안 되는 건 댁이 하고 있는 소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족히 만 끼는 차이 날 짬에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행히 얼마 전 들어온 장군의 딸이란 소문이 파다한 정령술사가 있다니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다만 좀 똘끼가 있다는 소문도 같이 돌고 있었지만 그 정도야 컨트롤을 못 하겠는가 싶었다.
‘가만. 혹시 그 장군이 사단장인가? 에이, 아니겠지.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정 하사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팔이 빠져라 삽질을 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허리 아프다고 징징대는 말년병장을 한 명 더 뽑아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고, 아마 나머지 열군데 초소도 여기처럼 흙바다가 됐을 것이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한다. 정 하사는 담배 한 대를 꼬나물고 말했다.
“야. 말년에 더 꼬이기 싫으면 알아서 데려와.”
말년병장들은 눈물을 흘렸다. 아마 내일 뉴스에는 유례없는 병장들의 대량 탈영이 보도될지도 모르겠다.
소총병 이병 신혜주. 특기 정령술, 약점 결벽증(더불어 개차반).
어둡고 습한 1평 남짓의 공간. 이끼가 가득 끼어 있고 쥐가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공간에 한 남자가 있었다. 여섯 개의 팔뚝만한 쇠말뚝이 사방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거기에 연결된 쇠사슬은 이중으로 남자의 팔다리와 목, 허리에 결속되어 남자를 허공에 지탱하고 있었다.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자 남자가 번쩍 눈을 떴다. 눈부신 안광과 함께 쇠사슬이 자르르 울리는 소리를 냈다. 이윽고 두께가 한 뼘은 넘어 보이는 육중한 철문이 칠판을 긁는 듯 소름끼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고 간수 한 명이 들어왔다.
“최철수. 오늘부로 영창 종료다. 또 연장을 바라나?”
“나는 전역하지 않겠다.”
병장 최철수. 영창을 나가는 순간 다음날 바로 전역하는 말년병장. 그런데 그는 벌써 영창 생활을 일 년 넘게 연장하면서 전역을 거부하고 있었다. 간수장 류성현 소위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아직도 그 이유는 말해줄 수 없나?”
최철수 병장은 그저 침묵뿐이었다.
“좋아. 오늘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원하는 대로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지 않고도 병으로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상부의 공문을 가지고 왔다.”
최철수의 눈이 번쩍였다. 탁한 공기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말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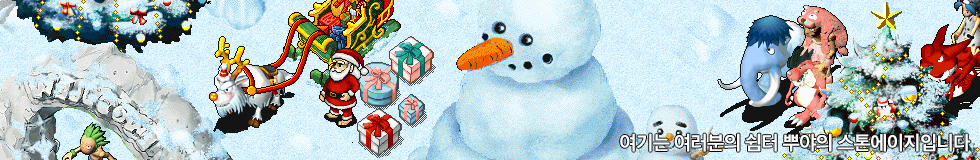
ㅋㅋㅋㅋㅋㅋㅋ 짬내나시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