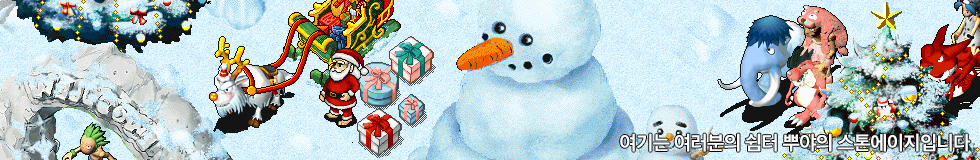눈 앞에 펼쳐진 상황에, 나의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아파옵니다. 조금씩 쓰라려 오는 통증도, 자츰 수그러드는 슬픔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내 눈 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나는 자각을 하지 못해, 그저 우울한 미소만 보일 뿐이야. 촉촉히 나의 발에 물든 시뻘건 영혼이 점차 내 쪽으로 흘러 올 때, 나는 서서히 이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해. 잠시동안 멈춰 있던 내 시선과 맞닿은 그들의 실체에 나는 조금씩 동공이 확장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두 다리가 떨려와. 그들이 들고 있는 형체 없는 무언가로 인해 점점 나의 숨통을 조여 오는 듯한 갑갑함을 느껴. 두 주먹에 불끈 쥔 갈 곳 잃은 육체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비관이라도 하는지, 그의 슬픈 눈망울엔 원한이 담겨져 있었다.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나는 이내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에,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 저 자식, 잡아!! "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찌 할 수 없는 나의 발걸음이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 나갔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닥칠거란 예감에 나는 이 시간을 지체 할 수 없었다. 한치라도 방심 했다간 내 목숨도 위험해질거라 생각한 나의 발걸음은 더욱 더 힘이 붙어 저 멀리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도심지로 달려갔다.
" 허억 … 허억 …. "
금방이라도 타들어갈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나의 두 다리는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고 말았다.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내들이 나를 쫓아옴을 알면서도, 나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평소와 같으면 내가 주저 앉은 이 거리는 사람들로 우글거려야 하는데, 사방 곳곳에서 새로 나온 아이돌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도로를 주행하는 낯선 이들의 크락션소리가 있던 이 거리는 지금, 쓸쓸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나를 따돌리려는 것처럼 이곳엔 나 외엔 그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뒤에서는 나를 쫓아오는 그들의 점잖은 목소리만이 내 등줄기를 찔러 왔고, 바닥에 주저 앉아 있던 나는 기운을 내 조금씩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 잡았다, 요놈! "
그러나 내 움직임과 그들의 움직임은 서로 비례했다.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전에 나한테 다가온 듯 싶었다. 검게 얼룩진 그들의 손아귀는 그대로 나의 목덜미를 붙잡았고, 힘없이 말을 잃은 나는 내 의사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붙잡혀 질질 그곳으로 돌아갔다.
철커덩 - ! 하고 닥침과 동시에, 빠져나간 내 몸은 다시금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슴을 쓸어 내리던 그곳엔 누군가의 묵직한 애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곳곳에 보이는 그들과의 사투에 물든 곳을 보자, 나의 조그마한 눈동자에도 슬픈 눈물이 흐른다. 나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 해야 하는걸까? 언제나 우리들은 자유를 원해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반갑지 않았다. 한시라도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을 파고 들어서까지 밖으로 나가길 원했지만, 우리들의 의사는 불문하고 그들은 무작정 우리들을 산채로 죽여왔다. 살려 달라고 빌어봤자, 그들에게 돌아오는건 싸늘하고도 섬뜩한 칼날 뿐, 우리의 목이 잘려나가 더 이상 비명을 지를 수 없는 상황이 와야만 그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 이 자식, 감히 겁대가리도 없이 도망을 가? 알았다, 요놈. 내일은 네 차례다. "
추악한 냄새와 보고 싶지 않도록 꾀죄죄한 그들의 얼굴을 차마 바라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나를 쳐다보곤 씨익 웃으며 밖으로 나섰다. 살해현장이 벌어진 곳 근처에는, 방금 전 살해 당한 친구의 가족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 만약 죄가 있다면 이런 곳에 온 죄 밖에 없겠지. 하루에 하나, 이틀에 둘, 사흘에 셋. 우린 그렇게 한 번의 자유도 못 느껴본 채, 그대로 죽음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나 역시, 내일이면 그들의 손에 이끌려 죽임을 당하겠지. 하지만 더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곳에서 하루 이틀을 살 바에, 그들의 손에 죽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뿐이다. 물론 죽는건 두렵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을 내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두려울 뿐이다. 죽은 내 친구들은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눈 속에는 불투명한 내가 보였고, 조금씩 잊혀지는 그들의 기억 속에 나는 그들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마 울 수 없었다. 이미 뒤늦게 울어봤자 그들은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목을 잘림과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갈라지는 그의 뱃 속엔, 오래 전부터 나와 함께한 그의 조각이 보였다. 하나씩 꺼내 흐트리면서 바닥으로 적시는 그의 눈물을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었다. 하루 하루 버티면서 오늘 나는 아니길, 내일도 내가 아니길, 제발 나는 아니기를 빌었던 내 대신에 죽어 나간 친구들만 대체 몇일까, 이제는 나 역시 지친 모양이다. 아침이 되면 또 한 명의 친구가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한 명의 친구가 죽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슬픈 감정에 힘겨워 왔다. 그들의 아픔을 대신 내가 느낄 수는 없을까, 그들과 나의 목숨을 바꿔 조금이나마 그들의 얼굴을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만 가득 했지만 정작 내 두 다리는 벌벌 떨고 있었다.
「 철커덩 」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슬프게 볼 필요는 없어졌다.
" 어제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네 차례다. 친구들이랑 안부 인사나 해두라고! "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날이다. 후회나 슬픔 같은건 없다. 하지만, 이 고통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원 없이 기쁠 뿐이다. 다만 내가 조금이나마 이곳에 미련이 남는다면, 그것은 이곳에 남아 있는 다른 친구들이 영원히 이곳을 빠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친구는 아마 없을거다. 자신의 인생의 반에 반도 도달하지 못한 그들에겐 차디찬 속박을 풀어 줄 죽음 밖에 없다는걸, 오늘 내가 죽음으로 더 이상 죽임을 당할 친구는 없겠지만, 내일 다른 아침이 밝아 오면 또 다시 한 친구가 내 뒤를 따를거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들의 의사는 아랑 곳하지 않고 말이다.
' …. '
한 번만이라도,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의 눈물과 원한이 담긴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한순간만이라도 이곳을 벗어나, 그들의 손에 억압된 우리의 자유를 찾고 싶다. 그들만 누렸던 이 생활, 우리들은 느낄 수 없었던걸까?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권리를 받으며 살 수는 없었던걸까?
「 끼익 」
그들의 손에 키워져,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했던걸까? 세상이라는 넓은 하늘 아래, 작디 작은 우물 안 개구리로만 살아야 했던 우리들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거였나? 단지 ' 우리 ' 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건가? 왜 우리는 그런 자유를 얻지 못한거지? 이 넓은 세상을 놔두고 우리들은 이렇게 싸늘한 시체가 되어야만 하냐고.
「 터억 」
원통하다. 이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내가 바보 같다. 이 넓은 세상 중,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하루만 더 살고 싶어 했던 나 자신이 경멸스럽다.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내게 또 다른 삶이 죽어진다면,
' . '
이런 식으로 살진 않았을텐데 ….
P.s : 쉬기는 한다만, 그래도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간단한 단편소설을 써봤네요. 즐감하세요.
P.s2 : 는 닭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