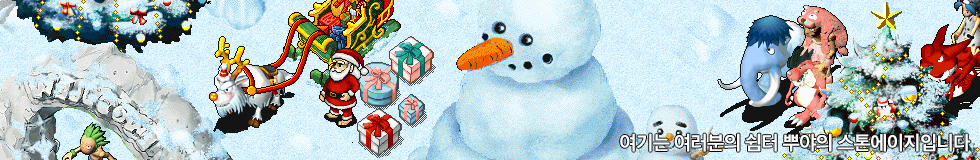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이미 이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루에르- 영원의 신념 -2 - 8“ 로라의 슬픈 눈망울에 걸린 작은 달의 형상이 보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싸늘하게 식은 채, 자신의 손에 겨우 힘을 부여 잡고 있는 란을 바라보면서 말이다. 란은 죽었다. 힘 없이 들려 있는 그의 손을 보며 울었다. 그는 죽어있지만 아직도 란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붉은 피는 아직까지도 따뜻했다. 란을 죽인건 마우린이였다.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쿠피디타스를 손에 차지하고 싶어했던 마우린이 저지른 일이니, 그 과정이 어찌됬던 오직 ' 쿠피디타스 ' 때문이란걸 로라는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다.
그가 죽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웃음을 잃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던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주인 잃은 인형이 영혼을 잃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에 멈춰선 인형과 같이, 그녀는 공허한 시간을 보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사람들도 활기를 잃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을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 로라가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한다. 무언가 떠올랐는지, 아님, 이런 자신의 모습을 죽은 란이 보면 어쩔까하는 마음에서인지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민가 앞. 그곳에 묻혀 있는 돌을 찾기 위해서일까? 그녀가 허겁지겁 땅을 파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파묻혀 있던 돌을 꺼내 품에 안는 로라, 그리고 흙더미 위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녀의 슬픔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간다. 그녀는 들고 있는 돌을 바라보며 흘러 내리는 눈물을 닦는다. 그리곤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이 그녀의 입술이 움찔거린다.
" …이 돌이, 절 지켜준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 ”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로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알려주었다. 로라는 울고 있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던 아픔을 나로 인해 다시 떠올리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의 목구멍을 무언가로 틀어 막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시야가 흐릿해졌기 때문에….
“ 로라는 란을 살리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된 행동을 저질렀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를 깨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 검은 별의 쿠피디타스의 능력을 사용하므로써 란의 생명을 저승에서 다시 불러 오는 것,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에 그녀의 눈가엔 쉴세 없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에겐 망설임은 없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였지만, 그녀에겐 ' 후회 '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는 지금 당장 란을 살리고 싶을 뿐, 자신의 눈 앞에서 살아난 란의 얼굴을 다시금 보고 싶어할 뿐, 그 모습에 로라의 슬픈 감정이 모두 쓸어 내려가기를 빌면서 말이다.
란이 죽은지 사흘이 되는 날 밤, 란은 로라에 의해 다시 한 번 생명을 얻게 된다. ”
로라가 저지른 행동, 그건 절대 악이 아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그대로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 가로 막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모조리 귀에 담은 나는, 왜 란이 그런 선택 밖에 할 수 없었고, 그토록 로라에게 그런 슬픈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을거다. 내가 아는건 그저 눈 앞에 벌어진 일들 뿐, 직접 보고 느낀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그 일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하는 생생한 이야기들만 있을 뿐, 나의 두 어깨가 부들부들 떨려오고, 눈에선 자꾸만 알 수 없는 물방울이 떨어진다. 란이 왜 그녀에게 그 돌을 넘겨 주었는지, 왜 그 돌을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그 돌에 의해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 하나 천천히 설명이 되는 것처럼, 순조롭게,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 란은 알고 있었다. 그 돌이 얼마나 신성스러운 힘을 지녔는지,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신성한 돌, 그 돌만 있다면 쿠피디타스는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금기의 금기를 어긴 능력. 하지만 그걸로 세상이 평화롭게 변할 수만 있다면 그의 선택은 변함이 없을거다. 그렇지만 결정을 해선 안되는거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그런 능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는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춘다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테니까, 그저 우리가 행한 악행만이 우리의 주위를 자꾸만 맴돌 뿐이니까. 그 슬픔을, 감당하기엔 그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
그리고 그 이후에 들이 닥친 두 번째 불행,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자신을 살려낸 로라의 죽음, 그것은 란에게 닥친 두 번째 시련이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였다. 란은 자신을 살린 로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 또한 그 금기를 어기면서 로라를 살린다. 그리고 자신 또한 로라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마을에 모든 힘을 쏟아 붇는다. 그 둘은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나는 용서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면, 나 또한 그런 선택을 했을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부서진 쿠피디타스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킨건 로라가 아니였다. 그저 로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쿠피디타스를 고친건 란의 유품인, 신성한 돌이였다. 이건 나와 라셀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을거다. 라셀 역시 순전히 로라 스스로가 고친거라 생각했지만, 그걸 복원시킨건 로라가 아닌 란의 유품, 그 돌은 쿠피디타스의 능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힘만이 아닌, 부서진 쿠피디타스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힘, 이 세상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될 힘이였다.
" …결국, 이 모든건 쿠피디타스로 인한 일들이였단건가. "
헛웃음 밖에 나오질 않았다.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충격은 변함없이 나의 뒷통수를 후려 쳤다. 이런 결말을 원한건 아니였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발뺌조차 할 수 없는, 가만히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뿐이였다.
그 뒤로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로라의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의 시간이랄까? 북 받쳐오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로라를 위한 약간의 시간이랄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감정을, 나는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고, 그렇다고해서 나조차도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이 미련한 나에 대한 짜증이 솟구칠 뿐이였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적 여유에, 이 시간마저 짧게 끊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원통할 뿐이니까.
" …이제 그만가요. "
" 하지만…. "
" 전 이제 괜찮으니까…그만…가요. "
발걸음을 재촉하는 로라,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내게는 그녀를 막을 힘도,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결정할 수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나의 등을 밀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때처럼 한 곳에 머물러 멈춰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그때, 만약 내 앞에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안았다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무언가를 해내야한다는 사명감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그녀가 아니였다면…난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보내고 있었을까…이 끔찍한 생각만 한다면, 나는 과연 진보할 수 있었을까….
가슴이 아려온다. 아려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절제되었던 눈물이 다시금 나의 심장을 울린다. 흘러 내려오는 눈물에 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담겨 있는 것처럼, 나의 심장박동은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졌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이런 비참한 내 모습을 감추려해도 차마 감출 수 없었다. 떠올리면 떠올릴 수록 나는 점점 이 상황에 적응할 수 없었다. 그런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없었다.
" …. "
난,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있는걸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건 그 아무 것도 없다. 내 스스로의 감정도 추스릴 수 없는 이 바보 같은 나를, 내 자신도 회피하려하는데,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냔 말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보는 로라의 시선이 애처롭게만 느껴졌다. 정작 위로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자신임에도, 내 어깨에 닿은 그녀의 손길이 너무나도 따뜻하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주체 못할 정도로 흘러 내리던 눈물이 끝을 보이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마음이 서서히 평온해지기 시작한건….
「 끼 이 이 이 익 ―… 」
잠시 그녀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도 나조차도 잘 모르겠다. 방금까지만해도 그녀의 슬픔에 덩달아 아파하던 내 가슴 속에, 무언가가 떠올라서일까? 그녀와 마찬가지로 나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작은 웅덩이에 불과했을까? 이젠 괜찮다고 여기던 생활이, 아직까지도 내 가슴 어딘가에서 나를 슬프게 만들고 있었던걸까? 나 자신은 느끼지 못했던 그 아픔들이, 로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로 반응하여 뒤늦게 나의 슬픔을 재촉했던 것일까. 모르겠다. 왜 내가 이런 감정에 휩싸여 이렇게 울어야만 하는지, 내 스스로는 내 슬픔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나를, 그녀만이 달래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내가 그녀로 인해 위로 받을 수 있는걸까…아직까지도, 나는 이 감정에 대해 잘 모르겠다.
" …거기까지다. 더 이상 움직이거나 반항하지마라, 그럴수록 힘들어지는건 너일테니까. "
내 목을 향해 길게 뻗어 있는 검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려졌다간, 금방이라도 나의 목을 베어 버릴 것 같은 그 남자의 눈빛을 봐서이다.
" 이런 곳에서 그런 여유를 보이다니…우리를 너무 얕본 것처럼 보이는군. 하지만, 그 여유도 여기까지다. "
활짝 열린 문 앞으로 검은 복면을 뒤집어쓴 남자가 천천히 나와 로라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가 검을 거두어서야 나는 가까스로 움직일 수 있었고, 다가오는 그 남자를 보며 나는 황급히 로라를 벽 쪽으로 밀착시켰다. 뚜벅 뚜벅 걸어오는 그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올 수록, 나의 등줄를 가득 적시는 식은 땀에 한기가 돌 정도였다.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다. 이대로 물러서면 하나 뿐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그렇다는건 더 이상 이 세계의 미래도, 내가 있던 세상의 미래도 변함없는 암흑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바로 코 앞까지 다가온 그 남자를,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그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내 기세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천천히 내 앞까지 다가왔다. 길게 늘여뜨린 검이 금방이라도 나의 목을 베어낼 듯한 위협을 보이며 천천히 나의 목까지 올라온다. 그 남자는 날카롭게 치켜뜬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 …끝이다. "
이내 그의 검이 나의 목을 향해 움직였다.
P.s : 앞으로 7편, 즐감하세요.
전체 글보기
| 뿌야의 스톤에이지 커뮤니티 전체글을 모아봐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69 | 무릇 | Flower | 2012.05.13 | 732 |
| 268 | 부흥서사 | Flower | 2012.05.11 | 683 |
| 267 | Noble Princess - 7 1 | 밥하몬 | 2012.05.07 | 671 |
| 266 | 망각 4 | 아인 | 2012.05.07 | 765 |
| 265 | 크로니클 어비스 45 | 아인 | 2012.05.06 | 781 |
| 264 | 부흥서사 1 | Flower | 2012.05.05 | 837 |
| 263 | 망각 3 | 아인 | 2012.05.03 | 861 |
| 262 | 망각 2 | 아인 | 2012.04.29 | 781 |
| 261 | 망각 1 | 아인 | 2012.04.29 | 841 |
| 260 | 크로니클 어비스 44 | 아인 | 2012.04.28 | 942 |
| 259 | 순환의 고리, 뫼비우스의 띠 | Flower | 2012.04.27 | 866 |
| 258 | 크로니클 어비스 43 | 아인 | 2012.04.27 | 840 |
| 257 | 루에르 후기 <2012/05/12 수정> | 아인 | 2012.04.26 | 817 |
| 256 | 루에르 96 [完] 4 | 아인 | 2012.04.25 | 788 |
| 255 | 루에르 95 | 아인 | 2012.04.25 | 666 |
| 254 | 루에르 94 | 아인 | 2012.04.24 | 733 |
| 253 | 루에르 93 | 아인 | 2012.04.23 | 757 |
| 252 | 루에르 92 | 아인 | 2012.04.23 | 794 |
| 251 | 루에르 91 | 아인 | 2012.04.23 | 795 |
| 250 | Untitled | Flower | 2012.04.23 | 706 |